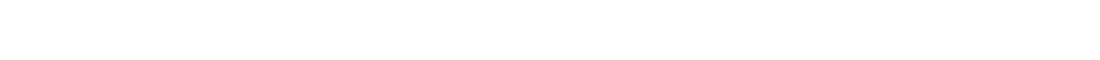*1986년부터 선수보호 차원 머리보호대 착용
*1993년부터 흰색 머리보호대, 청-홍으로 바꿔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언제부터 머리보호대(헤드기어)를 착용했을까?
1962년 대한태권도협회(당시는 대한태수도협회)가 경기규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태권도 경기화를 전개하던 시기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겨루기 선수들은 몸통보호구는 착용했지만 머리보호대(헤드기어)는 착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싱을 비롯해 격투기 종목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다치는 일이 잦자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태권도계도 머리보호대 착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1984년 3월 1일자로 경기복장 및 안전보호용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당시 공인 경기용품 품목은 태권도 도복, 몸통보호구, 샅보대, 팔다리보호대, 전광판, 경기용 매트, 머리보호대였다.
이경명은 당시 공인 절차에 대해 “공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견본을 제작, 각 국 협회를 경유해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회에서 제품과 사양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총재에게 재가를 받은 후 공인 인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1999년 1월호.>
태권도 선수들의 머리보호대 착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8월. 당시 IOC 위원장 사마란치는 복싱(권투)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복싱을 올림픽에서 제외시키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니 태권도도 올림픽에 채택되려면 위험도를 줄이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경향신문. 1985년 4월 27일.>
이에 따라 태권도 선수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황춘성은 “복싱 선수 사망 사건은 직접 펀치에 맞아 일어났다기보다는 쓰러지면서 캔버스에 뒤통수를 부딪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태권도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수 없는 대신 더 파괴력이 큰 발로 공격할 수 있는데다 마룻바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뇌진탕 위험이 더 크다”며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개발하고 있는 헤드기어는 복싱과 달리 뒤통수 부분이 크게 보완된 형태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985년 4월 27일.>
세계태권도연맹은 86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경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85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머리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경기규칙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경기규칙 개정에 따른 현장 적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198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머리보호대는 사용하지 못했다. 다만 태권도 경기 사상 최초로 회전이 끝난 후 전광판에 득점을 표출했다.
아시아태권도연맹은 1986년 4월 호주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 선수들에게 머리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팀 코치 김우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회에 사용한다는 헤드기어를 빌려 현지적응 훈련을 했다. 이 대회에서 KO로 승패가 갈린 게임이 6개나 된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헤드기어는 물론 보호구 착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선수들은 헤드기어를 처음 사용해 처음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1986년 6월호.>
그 후 세계태권도연맹은 1986년 6월 선수 보호를 위해 공식 대회에서 반드시 머리보호대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 달 후에 미국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기간이 촉박해 사용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팀 선수로 이 대회에 참가한 양대승은 “함께 참가했던 각 체급 선수들이 생각난다. 내 기억으로는 머리보호대를 쓰지 않고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27일 인터뷰>
1986년 국내 태권도계는 머리보호대 개발에 착수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이봉은 ‘태권도 경기 머리 부위 상해 예방’이라는 글에서 머리보호대 필요성과 제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태권도 선수들에게 가장 위험도가 높은 머리 부상을 놀랍게도 넘어지는 동작에서 기인한다. 최근 팬암 및 세계선수권대회 머리 부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얼굴이나 머리를 차이거나 뒤로 넘어졌을 때 선수가 기절하고 중심을 잃은 경우 적당한 기술에서 발생하는 어떤 의식불명으로 딱딱한 마룻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일어나는 것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므로 머리보호대 착용이야말로 명백한 위험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 마룻바닥에 넘어질 때 두개골의 뒷부분과 옆 부분을 보호하고 관자놀이 부위 골절상을 발차기로부터 막아내는 것이다. 머리보호대는 아마도 부드럽게 포장된 링이나 매트, 카펫 깔린 마루에서 벌어지는 경기에서는 굳이 강제규정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머리보호대 구조는 고무처럼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벼운 ‘패드’를 달고 뺨에 착 달라붙는 것을 권유한다. ‘패드’는 머리 뒷부분과 관자놀이 부위만 부착하면 된다.”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1986년 6월호.>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머리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하자 한국 대표선수들은 태릉선수촌에서 머리보호대를 착용하고 훈련했다.

초창기 머리보호대는 두껍고 재질로 앞 이마와 뒤통수 관자놀이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답답해 하거나 낯설어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몸을 돌려서 차는 뒤차기나 뒤돌려차기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릴 때 머리보호대가 시야를 가려 원활하게 공격할 수 없다는 불평도 나왔다. 페더급 한재구는 “방향 감각이 둔해지고 호흡에 지장이 있다”고 했고, 한국대표팀 코치 주신규는 “헤드기어 착용에 따른 전술과 기술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86년 7월 31일.>
세계태권도연맹은 1987년 7월 미국 마쵸 업체의 머리보호대를 경기 용품으로 공인한 후 199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머리보호대 등 공인 경기용품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1992년 8월 스페인에서 바로셀로나 하계올림픽이 열렸다. 태권도는 88서울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 태권도 선수들은 청(靑)·홍(紅) 색깔의 몸통보호구를 착용하고 경기했다. 하지만 머리보호대는 모두 흰색이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TV 중계에 맞춰 경기복으로 입는 도복도 청(靑)·홍(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운용은 흰 도복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몸통보호대처럼 머리보호대도 청·홍으로 바꾸겠다는 역발상을 제안했다. <대한체육회(2017). 세계를 품은 빅맨 김운용.>
이런 과정을 거쳐 머리보호대도 흰색에서 청·홍으로 의무화했다.
 ⏰ 2025. 04. 04 : 금요일
⏰ 2025. 04. 04 :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