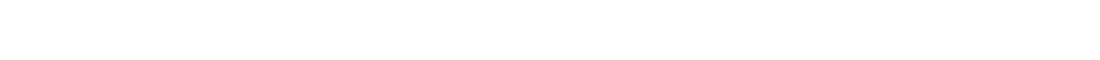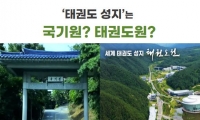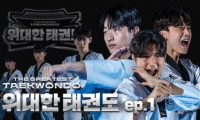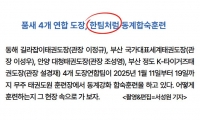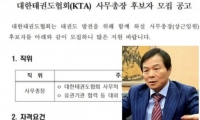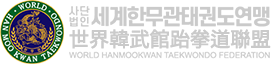-국기원과 태권도원이 진정한 성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통성·역사성·상징성을 갖추고, 동경·경외·숭배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방문하고 싶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키워야 할 것이다.

#‘태권도 성지’로 불리는 국기원이 난장판이 됐다.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에 외부인들이 난입해 온갖 오물을 투척한 건데, 결국, 이사회는 연기됐다. <SBS. 2013년 6월 1일.>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원에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 대회와 태권도 수련 및 학술 교류, 전지훈련 등 전문 태권도인을 위한 공간으로도 명성을 크게 얻고 있다. <MK스포츠. 2025년 1월 22일.>
따져보자. ‘태권도 성지’는 어디일까. 국기원일까, 태권도원일까. 두 곳은 태권도 성지의 자격을 갖췄을까.
‘성지(holy place·聖地)’는 종교·신앙·전승에 의해서 신성시되는 일정한 지역을 뜻한다. 성소(聖所), 성역(聖域)이라고도 한다.
‘성지’는 산과 숲, 샘 등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자연경관이 성자나 영웅과 일체가 되어 성지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성지’는 기본적으로 숭배와 예배의 공간이다. 관련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야 하는,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예루살렘과 로마의 바티칸궁전, 잉글랜드의 캔터베리대성당, 스페인 몬세라트수도원 등이 대표적인 성지이다. 우리나라에도 솔뫼성지, 절두산순교성지 등이 있다.
물론 시대 흐름과 변화에 따라 고전적인 성지 개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 곳이 성스러운 인물과 신앙 및 전승의 상징 공간이면 폭넓게 ‘성지’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수단으로 성지를 남발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인기 있는 장소, 즉 ‘핫 플레이스(hot place)’를 성지라고 해도 되는 지는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주와 태권도원은 태권도성지라고 할 수 있을까. 무주는 태권도 기원과 유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명징한 사료(史料)가 없고, 태권도 현대사와 관련된 질곡의 숨결과 태권도 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곳도 아니다. 인공적인 시설물을 짓고 정부의 지원 속에 태권도 진흥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태권도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다고 해서 ‘무주=태권도 성지’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무주와 태권도원은 태권도와 관련된 숭배와 예배의 공간도 아니고, 태권도를 둘러싼 인문학적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곳도 아니다. 그렇다고 국내외 태권도인들과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곳도 아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대회와 교육 등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방문자들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태권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2023년 연간 방문객 약 32만 명 중 순수 방문객은 10% 정도 되는지 묻고 싶다. 국책사업 일환으로 무주 설천면에 <태권도원>을 조성한 것을 근거로 ‘무주=태권도원=태권도 성지’라고 홍보하는 것은, 현재로선 억지 춘향 격이다.
국기원은 어떤가. 1972년 준공된 국기원은 태권도 중앙도장의 역할(기능)을 53년 동안 수행해 오고 있다.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국기원에 대해 “태권도 세계화를 선도하는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국기원 누리집)고 말했다.
국기원은 태권도원에 비해 전통성·역사성·상징성을 갖췄다. 하지만 ‘태권도의 역사와 미래, 국기원이 중심’이라고 내건 슬로건에 부합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성지는 기본적으로 동경·경외·숭배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국기원은 낙후·폐쇄·모략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그래서 성지답지 않은, 시간 내서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가 봤자 불편한 곳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기원과 태권도원이 진정한 성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태권도인들과 일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통성·역사성·상징성을 갖추고, 동경·경외·숭배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방문하고 싶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키워야 할 것이다.
 ⏰ 2025. 02. 05 : 수요일
⏰ 2025. 02. 05 : 수요일